정민영의 보르도 샤토 방문기(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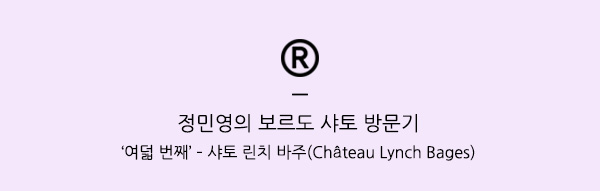
이문세의 노래 ‘옛사랑’ 가사중에서도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이런 한구절 한구절의 가사는 가슴으로 펜을 쥐어 써 내려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다.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글썽이나봐 그대일까 그댈 보낸 미련일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의 말 다 지우니 이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이해리가 부른 박상민의 불후의 명곡 ‘해바라기’ 가사의 구절은 비슷한 경험 한 번씩 했던 사람들이라면 정말 오래간만에 가슴 깊이 간직했던 추억의 상자문의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러보지 않았을까 싶다.
저렇게 아름다운 가사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아파해야 하고, 그 수많은 사연을 어떻게 문장 하나에 집약시켜서 가슴에 전달할 수 있을까? 경이로울 따름이다. 하긴 작은 요구르트 한 병에도 건강을 담긴했구나! 음식방송 프로그램에서 TV 리포터가 완성된 음식을 시식하고 나서 어떻게 맛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냐에 따라서 시청자들 입 안의 침의 양은 달라질 것이다.
샤토 린치 바주(Château Lynch Bages)에 가면 와인의 맛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직원이 있다.
지난번에 샤토 린쉬 바쥬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필자 말고도 미국 4인 가족이 벤츠를 타고 왔고, 또 동양 여자 한 명이 기사가 딸린 12인승 미니밴을 혼자 타고 샤토에 도착했다. 필자는 속으로 “오늘은 왜 이렇게 주머니에 쇳가루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하면서 열심히 샤토 구석구석을 카메라 메모리에 저장시켰다. 오후 2시가 되자 와이너리 직원이 투어에 참여할 인원 점검을 하고는 바로 투어가 시작이 되었다.
미국 가족의 분위기는 애들은 13~14살 정도로 보여서 와인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았고, 아빠가 와인을 좋아해서 엄마가 봉사(?)차원에서 같이 따라 와 준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동양 여자였다. 영어를 꽤나 잘하지만 왠지 짜장가루가 묻어있는 발음이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홍콩이나 중국 남방계통으로 보였다. 몸에 걸친 명품부터 시작해서 (명품이 잘못된 것은 아님) 말투, 태도가 아주 완전 ‘4가지’가 없었다. 와인 브로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섞어가면서 샤토 직원에게 거만하게 물어보는 태도며, 미국인 가족이 직원에게 와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 ‘4가지’ 없는 애가 중간에 가로채서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4가지’ 없는 애의 태도에도 샤토 직원은 차분하고 유익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었다. 진정 프로다웠다.
샤토 린치 바주의 규모는 100 헥타르 정도로 꽤나 볼륨이 있다. 100 헥타르 중에서 약 5 헥타르 에는 화이트 와인용 포도품종이 심어져 있다. 지역 떼루아에 맞추어 세미용, 쇼비뇽, 그리고 마스카델 3종류이고 일년에 20,000병 정도로 시범 생산하고 있단다.
샤토 린치 바주의 이름은 옛날 오너의 이름과 Bages 라는 동네 이름을 붙인 것이다. Lynch의 가문은 옛날 옛날 아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다 폐암으로 죽은 시절의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이다. 그런데 영국과의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보르도로 피난 내려왔다가 프랑스 여인과 결혼해서 포이약지역에 뿌리내린 성공한 가문이다. 그리고 Bages는 필자 생각에 세상에서 제일 작은 동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고 앙증맞다. 동네 중심 상가를 한 바퀴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28초면 된다.
샤토 린치 바주의 특징은 1970년대까지 와인 만들었던 방식과 그 당시 사용했던 물건들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박물관처럼 꾸며 놓은 점이다. 전통방식과 현대 와인생산 기술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와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된다.
샤토에서의 투어가 막바지로 들어섰다. 와인 잔이 이미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테이블로 우리는 안내되었다. 직원은 우리에게 자회사 와인과 샤토 린치 바주 와인을 비교하면서 테이스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자회사 와인은 생테스테프(Saint-Estephe)에 위치한 샤토 옴 드 페즈(Château Ormes de Pez)였다. 토양과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같은 포도 품종이라도 어떻게 맛이 다른지를 아주 자신만만한 윤리 선생님처럼 조곤조곤 두 와인을 시음시키며 설명을 해주었다.
그런데 와인에 대한 표현이 너무 감성적이었다. 몇가지 기억나는 대로 인용을 해보자 Saint-Estephe의 와인은 굉장히 거칠고 남성적이어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아주 공격적인 와인이고, Pauillac의 와인은 그에 비하면 부드러우면서도 논리적이고, 꾸준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침착한 와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와인 잔을 우리에게 건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또다시 시(?)를 읇기 시작했다.
“와인의 색깔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10대 청년같고 혀를 누르는 무게는 40대의 중후함이 느껴지지만 끝 맛을 이어가는 목넘김은 수 많은 경험을 한 60대의 노련함’이라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좀 의역을 해서 기술 했음).
직원의 감성적인 설명을 들으니 와인 한 잔을 마신게 아니고 문학 한 모금을 마신듯한 느낌이었다.
물론 술이란 먹고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또한 맞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본인이 그렇게 마시고 싶다면 그렇게 마시는 것이다. 하지만 와인에 대한 맛을 이야기 할 때는 와인의 맛 보다는 와인에 담겨져있는 철학에 취해보는 것도 멋지지 아니한가!
필자에게는 가수 이문세의 ‘옛사랑’을 작곡, 작사를 한 이영훈님, 그리고 박상민씨의 실화를 해바라기에 옮겨 담은 시인 조은희님과 동시대에 살았다는게 행운이고 고마울 따름이다.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 “산넘어 남촌에는 도대체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는거지?”
+
WRITTEN BY 정민영 (Min Young Jung)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